SCIENCE WAVE
사이언스웨이브는 과학으로 마법 같은 세상을 만듭니다.
sciencewave.kr
성냥의 탄생
담배를 피우거나 촛불을 켤 때, 또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사용하는 성냥은 1805년부터 유럽에서 개발되기 시작하여, 많은 화학자들의 연구와 개선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성냥이 나오기 전에는 불씨를 얻기 위해 언제나 원시적인 방법(나무토막 부비기, 부싯돌 사용 등)을 써야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에 처음으로 성냥 공장이 생겨났다고 한다.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 1805-1875)은 안전성냥이 편리하게 보급되기 시작했던 1845년에 유명한 동화 <성냥팔이 소녀>(The Little Match Girl)을 썼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냥의 머리에는 염소산칼륨(KClO3)과 황(S)을 접착제로 갠 것을 동그랗게 붙여놓았다. 그리고 성냥 곽 표면에는 적인(赤燐)과 유리가루를 섞은 것을 접착제로 발라두었다. 성냥 머리를 이 부분에 대고 쓱 문지르면, 마찰열에 의해 성냥 머리에 불이 붙는다.
성냥 머리의 주성분인 '황(S)'이라는 노란색 원소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점화되어 푸른색 빛을 내며 탄다. 한편 염소산칼륨은 산소를 내놓아 황이 빨리 불붙도록 점화작용을 돕는다.
한번 젖었던 성냥은 마르더라도 불이 붙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염소산칼륨이 물을 흡수하여 녹아버렸기 때문이다. 성냥 머리에 포함된 풀이나, 성냥 곽에 바른 접착제도 수분을 흡수하면 눅눅해져 마찰 효과가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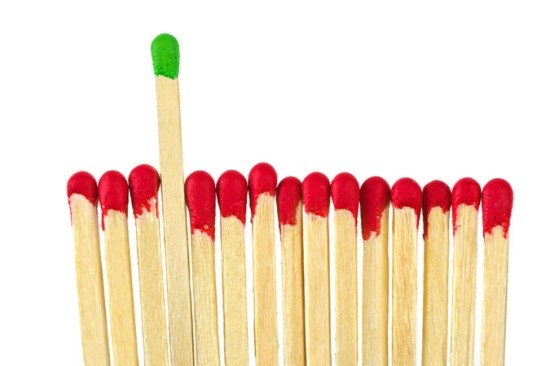
안전성냥은 성냥곽에 칠한 마찰면에 대고 빠른 속도로 부벼야 점화된다.
안전성냥과 딱성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안전성냥은 돌이나 마른 나무에 대고 아무리 부비더라도 불이 붙지 않으므로 화재 위험에 안전하다 하여 ‘안전성냥’(safety match)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안전성냥이라 하지만, 성냥을 잘못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고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안전성냥이 담긴 곽에는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잘 붙는 성질을 가진 붉은 인(적린 赤燐)과 유리 가루를 아교에 섞은 것이 칠해져 있다. 성냥 머리를 이곳에 대고 부비면, 유리 가루와의 마찰에 의해 성냥 곽의 적린에 먼저 불꽃이 일어 그 불이 성냥개비 머리로 옮겨 붙는다. 어둠 속에서 성냥을 켜보면 불꽃이 발생하고 옯겨붙는 현상을 잘 볼 수 있다.
성냥 곽 면이 아니더라도 돌이나 시멘트 등 단단한 것에 대고 문지르면 불이 붙는 성냥을 ‘딱성냥’이라 한다. 딱성냥의 머리에 포함된 적린은 섭씨 240도를 넘으면 불이 붙는다.
적린 성냥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흰색의 인(백린 白燐)을 사용한 성냥이 잠시 동안 보급되었다. 백린 성냥은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그 때문에 화재가 자주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백린을 먹거나 하면 인체에 매우 유독하기도 했다.
100년이 넘도록 생활필수품이었던 성냥이 지금은 자동점화장치와 가스라이터가 나오면서 사용량이 아주 줄었다. 심지어 안전성냥을 켜본 적이 없는 청소년도 있다고 한다. *

가스라이터가 사용되면서 성냥은 좀처럼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가스라이터의 원리는 '자동점화기' 참조)
열의 대류(對流)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SCIENCE WAVE사이언스웨이브는 과학으로 마법 같은 세상을 만듭니다.sciencewave.kr “열(열에너지)은 전도(傳導 conduction), 방사(放射 radiation), 대류(對流 convection) 3가지 물리현상에 의해 한 곳에서 다
sciencewave.tistory.com
'과학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압의 단위인 헥토파스칼이란? (0) | 2025.01.22 |
|---|---|
| 빛의 반사와 굴절 현상을 이용한 광학도구 (0) | 2025.01.22 |
| 열의 대류(對流)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0) | 2025.01.20 |
| 전자렌지 안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고 큰 소리가 나는 이유 (0) | 2025.01.20 |
| ‘손톱위에 코끼리가 올라서는 수압’ 심해 물고기는 어떻게 견딜까? (0) | 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