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CIENCE WAVE
사이언스 웨이브(Science Wave)는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최신 과학뉴스와 쉽고 재미있는 과학상식을 전달합니다.
sciencewave.kr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붉은 달을 보면, 중천에서 보는 달보다 훨씬 크게 보인다. 그러나 각도기를 사용하여 달의 시직경을 측정해보면, 수평선 상이나 중천이나 동일한 약 0.5°이다. 수평선 상의 보름달이 시각적으로 크게 보이는 환상(幻像)의 원인은 에메르트의 법칙(Emmert’s law)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법칙을 이해하려면 시직경과 잔상에 대한 약간의 상식이 필요하다.
시직경(시각도, 시지름)이란?
천문학을 배우면 시각도(視角度) 또는 시직경(視直徑)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지구상에서 태양이나 달 또는 다른 천체를 보았을 때, 시야에 보이는 그 천체의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용어이다. 사방이 탁 트인 곳에서 두 눈이 전면을 바라보는 시야(視野)의 각도(angular size)는 180°이고, 태양과 보름달의 시각도는 모두 약 0.5°이다.

시야의 각도(시각도)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Actual diameter는 실제 지름이고, Angular diameter는 시각도(0.5°)를 나타낸다.

팔을 자기 얼굴 앞으로 뻗은 상태로 손과 손가락으로 시각도를 대략 측정하는 방법이다. 맨왼쪽 주먹은 10°, 두 번째 펼친 엄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의 각도는 20°, 손가락 3개의 시각도는 5°, 새끼손가락 1개의 시각도는 1° 정도이다. 달과 태양의 시각도는 새끼손가락 시직경(시각도)의 절반이다.

수평선 상의 해와 달이 크게 보이는 이유를 일반적으로 “수평선 방향에 함께 보이는 지상의 나무나 집과 비교되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행사들은 비교 대상이 전혀 없는 상공에서 수평선 상의 보름달이 아주 크게 보이는 것을 경험한다. 인간의 눈은 매우 정확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매우 많다.
착시를 일으키는 눈의 잔상(殘像) 현상
인간의 눈은 앞에 보이던 물체가 사라진 후에도 잠시 물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것을 잔상(afterimage)이라 하며, 잔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발명품이 영화 필름이다. 눈이 잔상을 느끼는 이유는 망막에 있는 추상세포(원추세포)에 있다. 추상세포에는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은 청색, 녹색, 적색을 감각한다. 예를 들어 붉은 물체를 보고 있으면 붉은색 원추세포가 자극을 받아 그 신호를 뇌로 보내어 “저것은 붉은색이다.”라고 판단하게 한다.
특정 색체를 오래 보고 있으면 추상세포는 피로해져 잠시 그 색을 감가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아래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붉은 원점을 30초간 바라보다가 오른쪽의 동심원이 그려진 흰 면의 중심으로 시선을 옯겨 바라보자. 그러면 흰 면에 흐린 청록색 영상이 몇 초 동안 보일 것이다. 붉은 원형이 잔상으로 남았다면 흰 면 위에는 붉은 원이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붉은 원은 사라지고 왜 청록색 원이 잔상으로 남을까?

붉은 원만 바라보던 눈이 흰 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청, 녹, 적 3종의 원추세포의 잔상이 흰 면에 남는다. 그런데 붉은 원추세포만은 30초 동안에 피로해져 적색 잔상을 감각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청, 녹 두 원추세포들만 잔상을 느껴 중간색인 청록색을 희미하게 느끼게 된다.
위의 붉은 원 착시 그림을 보면서 다른 실험도 해보자. 50cm 거리에서 붉은 점을 바라보다가 30초 후 흰 면을 같은 거리 50cm, 가까운 25cm, 먼 75cm, 더 먼 1m 거리에서 보자. 잔상으로 남는 청록색 원의 크기가 작아지는가, 크지는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1-5까지 동심원에서 관찰해보자. (이 실험을 PC 화면이 아니고 스마트폰 화면으로 해본다면 관찰 거리를 절반 정도 줄여서 보자.)
에메르트의 법칙(Emmert’s law)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면 붉은 원은 더 작은 원으로 보이고, 멀어지면 큰 원으로 인식된다. 이것을 ‘에메르트의 법칙’이라 하는데, “물체를 인식하는 시직경은 바라보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이 법칙은 독일의 물리학자 에메르트(Emil Emmert 1844-1911)가 1881년에 처음 발표했다.
수평선 상의 둥근 달이 얼마나 커다랗게 보이는가는 에메르트의 법칙과 관계가 있다. 즉 보름달이 수평선 위에서 크게 감각되는 것은 ‘뇌의 시직경 계산’에 착오가 생긴 탓이다. 에메르트의 법칙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어려운 물리학이 된다.

중앙에 있는 청색 사각형을 30초간 보다가 시선을 황색면 바닥선으로 옮겨 바라보자. 또 시선을 윗면 천정선으로 옮겨 보자. 어떤 색의 잔상이 남는가? 바라보는 거리를 가까이 또는 멀리 하면 잔상의 크기는 어떻게 변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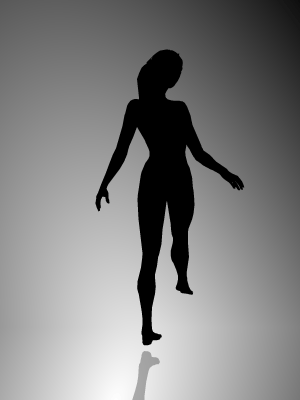
이 동영상의 댄서는 보기에 따라 시계방향으로, 반대방향으로 돌고 있는 착시현상이 나타난다.
인간의 시신경과 뇌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광학적 착시현상(optical illution, visual illution)은 원인이 밝혀진 것도 있고 아직 모르는 것도 있다. 착시현상을 인식하는 도형이나 실험은 무수히 많다. 인간에게 착시현상이 없다면 마술사들은 직업을 잃을 것이고, 온갖 전광판의 영상은 재미가 줄어들 것이며, 3D 영상도 제작이 어려워질 것이다. 착시현상은 인간에게 불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준다고 생각된다. - YS
야행성동물의 초감각적 시각(視覺)
Home - SCIENCE WAVE사이언스 웨이브(Science Wave)는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최신 과학뉴스와 쉽고 재미있는 과학상식을 전달합니다.sciencewave.kr 동물의 세계에는 밤에만 먹이활동을 하는
sciencewave.tistory.com
'과학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태양전지는 햇빛을 받으면 왜 전류가 흐를까? (0) | 2025.02.24 |
|---|---|
| 수학적 무한을 향한 흥미로운 여정 '무한의 불가사의' (0) | 2025.02.24 |
| 야행성 동물의 초감각적 시각(視覺) (0) | 2025.02.24 |
| 무지개 빛을 내는 투명한 민물고기 – 그 이유? (0) | 2025.02.24 |
| 눈송이가 6각형이 되는 과학 (0) | 2025.02.24 |